달라도 너무 다른 남북한 전력산업
6.25 휴전협정 이후 6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강산이 6번 이상 바뀌는 동안 남과 북은 교류가 거의 없었다.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전기도 마찬가지다. 전력체계도 규격도 운영방식도 달라졌다. 전력 기자재의 표준화도 이뤄지지 않은 지금, 남북 전력 협력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간단한 과제가 아니다.

설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할 때 가장 먼저 내뱉은 단어다. 이 단어 뒤에는 ‘통일이 정말 되는 건 아니야?’라는 문장이 숨어있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방문하기 전에도 같은 단어가 튀어나왔다. 이때는 ‘진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까?’라는 문장이 감춰져 있었다.
설마라는 단어는 기대감을 선물해준다. 하지만 통일 향한 기대감을 현실로 만드는 건 쉽지 않다. 전력 상태만 봐도 그렇다. 통일에 앞서 전력 협력을 이뤄야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남북 전력 협력 준비
남북통일 가능 여부는 알 수 없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냐는 질문보다 어려운 게 남북통일 가능 여부다. 통일 방법 역시 장담할 수 없다. 단번에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남북이 한 단계씩 발을 맞춰나가 결국에는 통일을 이루는 방법도 있다. 관계자들은 마지막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한다.
통일 이후 남북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식량 협력이 필요하고, 북한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전력 협력도 필요하다.
2014년 전기산업진흥회 주도로 ‘전기산업통일연구협의회’가 구성됐다. 통일에 대비해 전력산업 분야가 할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전기산업통일연구협의회는 통일을 앞두고 민간 전기산업계가 할 일과 북한 전력공급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15년에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전기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한 ‘남북 전력 기자재 통일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에서는 남북 전기산업 현황 진단과 전력 기자재 표준화 방안 등에 대한 담론을 나눴다. 전력산업계에서는 처음 시도된 행사였다. 이 포럼에서 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숭실대학교는 ▲전기산업계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 정보자료 공동조사, ▲남북 전력 기자재 표준화 방안 마련 ▲북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 ▲통일 관련 세미나 및 국제포럼 공동개최, ▲북한 정보자료 DB 및 정보시스템 구축, ▲통일 관련 업무 정보공유 및 확대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 = 김동원 기자>
전력 통일의 시작, 기자재 표준화
지난 4월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전력산업계는 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북한 전력산업은 다르다. 전압체계가 다르고, 기자재 규격이 다르다. 계통운영방식 역시 다르다. 남북한이 서로를 향해 총구멍을 겨냥한 시간이 길어도 너무 길었다.
남한 전압체계는 송전 전압이 156, 345, 765kV다. 북한은 66, 110, 220kV다. 배전압은 남한이 22.0kV, 북한이 3.3~22kV다. 게다가 북한은 주파수(60Hz)가 불안하고, 전압도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력 기자재의 표준화가 남북 전력 협력의 출발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다음 해야 할 일이 ‘북한 전력공급 높이기’와 ‘송전망 연결’이다. 북한 송전망이 남한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통일비용은 상당하다.

원래 북한은 전력 부자였다
사실, 남과 북의 전력 구조는 반대였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될 때만 해도 북한은 전기 부자였다. 남한은 북한에서 전기를 얻어 사용해야 했다. 일본에서 해방된 이후 북한은 풍부한 수자원 이용,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일본이 남긴 발전소도 많았다. 수풍, 허천강, 장진강 등에 6개소의 발전소가 있었다.
당시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172만 270kW 규모였다. 남한은 북한 발전설비 용량의 11.5%인 19만 8,700kW에 불과했다.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 전력설비들은 대부분 기능을 상실했다. 석탄 생산량 감소, 화력발전설비 도입 부진 등의 문제도 겪었다. 게다가 대북제재까지 겪으며 북한은 전력 가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한은 달랐다. 남한 전기기기산업은 큰 규모로 성장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전기기기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수출도 했다. 2013년 남한 전력기기 수출은 150억 달러를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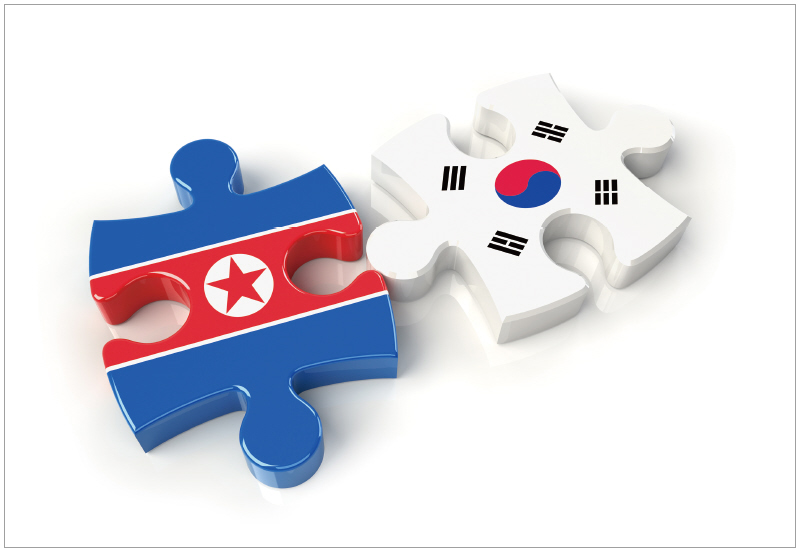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남한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한계는 있다. 산업 성장을 이룰 토지는 제한돼있고, 자원 역시 한정돼있다. 남한 전기기기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선 북한이 필요하다.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북한은 발전 잠재량이 풍부하다. 남북 전력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통일과 경제 성장 모두를 이룰 여지가 충분하다.





